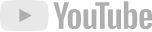마을서 자유롭게 함께 늙어가는 삶…‘한국형 주치의’가 열어줄까
페이지 정보

마을서 자유롭게 함께 늙어가는 삶…‘한국형 주치의’가 열어줄까
본문
“늙어서 요양원에 가지 말고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자는 거지.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감옥인데, 마을에서 자유롭게 밥도 먹고, 텃밭도 가꾸고,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대실마을복지영농조합 홍길식(75)씨는 전남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대실마을은 노후와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삶의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 정중기(70)씨가 덧붙였다. “마을공동체 안에서 점심도 같이 먹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지원하는 의료·복지 시스템도 갖추려고 한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계마을도 돌봄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 현재는 흩어져 있던 농어촌민박들이 손잡고 “마을 전체가 숙소가 되는” 분산형 마을호텔을 조성했는데, 궁극적 목표는 ‘마을 요양원’을 만드는 것이다. 마을호텔 운영을 맡은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조문환(63) 대표는 “주민들을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우리 마을에서 함께 돌보고 삶을 마감하도록 하자. 이게 매계마을의 꿈”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 주치의 제도 시행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나주 대실마을과 하동 매계마을이 꿈꾸는 ‘돌봄 마을공동체’를 떠받치는 핵심 의료 인프라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보면, 내년 7월부터 50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환자가 동네 의원을 주치의로 등록하면, 주치의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방·유지군’부터 ‘전문관리군’까지 4개 관리군으로 나눠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방문·재택진료가 필요한 전문관리군의 경우, 주치의가 지역사회와 손잡고 가정 내에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무엇보다 주치의는 생애말기 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증 및 증상 관리 △치료 방향 결정 지원 △의료진 간 협력 체계 구축 △환자의 사회·정서·영적 요구 대응 등을 전담한다. 특히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을 조언하거나 의사결정을 돕는 가교 구실도 맡게 된다.

연명의료 거부 희망 84%, 실제 17%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대표적인 생애말기 돌봄이다. 65살 이상 노인의 84.1%가 연명의료 거부를 원하지만, 실제로 65살 이상 사망자 중 연명의료 중단 비율은 16.7%에 그친다. 노인 대다수가 본인의 뜻과 다르게 생애말기에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왜 그럴까?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생애말기 돌봄 시스템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가로막는 네 가지 구조적 제약에 갇혀 있다.
첫째, 임종 전 의료 선호를 미리 논의하는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의 74%가 ‘이미 병에 걸린 후’에야 서류를 작성하며, 건강할 때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비중은 26%에 그친다.
둘째, 의료 자원과 환자가 대형병원에 몰리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은 중소 전문기관에 편중돼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대형병원 환자들은 생애말기에 적절한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셋째,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에만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지만, 그 정의가 의학적으로 모호하다. ‘6개월 이내 사망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예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넷째,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어도 이후를 책임질 돌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입원형 호스피스는 103곳에 불과하며, 평균 대기 기간은 18~19개월에 달한다. 가정 호스피스 인력 또한 전무한 수준이다. 결국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모든 간병 부담이 오롯이 가족의 몫으로 남는다.

주치의가 있으면 병원 사망 감소
주치의 제도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생애말기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열쇠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임종 돌봄은 왜 사람들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는가’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병원 사망률은 68%로, 오이시디 평균(49%)을 크게 웃돌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주치의 제도가 정착된 네덜란드의 병원 사망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오이시디 보고서는 네덜란드를 “‘집에서 맞는 임종’이 가장 흔한 유일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등록해야 한다.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특히 생애말기에는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네덜란드의 지역 사회 돌봄 모델인 뷔르트조르흐(‘이웃 돌봄’라는 의미)는 동네 주치의와 방문간호사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지역 돌봄 체계로, 집에서 받는 돌봄의 질을 높이면서도 비용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0~12명 규모의 자율 간호팀이 동네 단위로 환자를 맡고, 주치의는 이 팀과 소통하며 의학적 판단과 처방을 내린다. 이 모델을 설계한 전직 간호사 요스 드 블록은 “동네 주치의가 간호사를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불필요한 입원과 중복진료가 줄고 예방·조기개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를 위한 호게베이크 ‘치매 마을’은 2009년 문을 열었다. 슈퍼마켓·카페·극장·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어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명 안팎의 주민 모두가 중증 치매 환자이고, 집마다 돌봄 인력이 상주한다. 이 마을의 주치의는 다른 네덜란드 지역사회에서 그렇듯, 환자의 의료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몸 상태가 악화하면 전문병원 진료나 입원을 조율한다. 치매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주치의가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이다.
네덜란드가 지역 사회 돌봄에 성공한 비결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법적 체계에 있다. 생애말기 돌봄 서비스는 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법, 사회지원법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법은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말기 환자를 위해 시설 입소와 재가 요양을 보장하며, 건강보험법은 방문 주치의와 완화의료, 방문간호 등 의료적 처치를 전담한다. 여기에 사회지원법이 주거 환경 개선과 가사 지원 등 생활 지원을 뒷받침한다. 의료와 요양, 복지가 단절 없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통합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이 체계의 핵심인 주치의는 ‘총괄 조정자’로서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해 환자 맞춤형 돌봄을 설계한다. 이러한 통합 돌봄 덕분에 네덜란드의 노인들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제도적 뒷받침
네덜란드의 사례는 내년 도입될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보여준다. 핵심은 주치의가 단순한 진료 제공자를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진두지휘하는 ‘총괄 조정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암 등 특정 질환에 국한된 현행 호스피스 제도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애말기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덜란드가 의료·요양·복지의 세 축을 바탕으로 생애말기 돌봄을 구현했듯, 한국형 주치의 제도의 성공 역시 간호사·약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분야 간 경계 없는 원팀 협력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료와 요양,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통합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노쇠나 질병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법 시행에 따라 각 읍·면·동에는 통합 지원의 거점인 ‘전담 창구(케어안내창구)’가 생기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가 가동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이 협력 기관으로 지정돼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전망이다.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맞물리면서, 나주 대실마을이나 하동 매계마을처럼 이웃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돌봄 마을공동체’가 전국 각지에 뿌리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사진 정은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기자 ejung@hani.co.kr
관련링크
-
한겨레 관련 기사 링크주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6932.html
384회 연결
- 이전글클래식이 마을을 깨우다…소공연장의 예술 실험 26.01.05
- 다음글“지구가 아파요” 3살 아이의 실천이 부모를 바꾼다 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