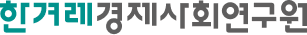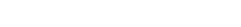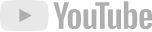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은 지역 안에 있다
페이지 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비결은 지역 안에 있다
본문
경제 불평등과 기후 위기, 급속한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년간의 조사·분석을 거쳐 지난 7월 공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경제·사회 전반의 자생적 역량을 진단한 첫 종합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답 형식으로 평가 방법과 선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지역 회복력이란 무엇인가.
지역 회복력 평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 같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됐다. 대기업 투자나 정부 재정 투입 같은 외부 지원은 단기적으로 부를 늘리지만, 그 효과는 지역 밖으로 곧 빠져나가버린다. 그래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주민에게 이익이 분배·재투자되는 건전한 경제 구조가 중요하다. 이런 자생적 구조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변화에 대응하고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지역 회복력’의 핵심이라고 본다.
―무엇을 평가하는가.
환경·경제·사회 3개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탄소중립·자원순환·지역내총생산·주거·교통·시민사회 등 10개 부문과 38개 세부 지표로 평가한다. 총 100점 만점으로 영역별 배점은 환경 30점, 경제 30점, 사회 40점이다. 특히 사회 영역은 공중보건, 사회복지, 주거·교통, 시민사회 등 4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다른 영역보다 비중이 크다.
―평가는 어떻게 진행됐나.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청·공공데이터포털 등 자료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우수 지자체 후보군 가운데 부정적 이슈가 있는 곳은 최종 후보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적용했다.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2023년부터 직전 3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장이 비리나 부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되거나 당선 무효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수재·화재 등 인재 발생 시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경우에 해당된다.

―수상 부문과 수상 지자체는.
수상 부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국 226개 지자체 중 환경·경제·사회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10곳에 종합상을 수여한다. 둘째, 영역별 우수 지자체로 환경·경제·사회 각 영역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인구나 행정구역 규모는 작지만 세 영역에서 균형 잡힌 회복력을 보여준 지방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따로 뽑아 순위를 매긴다.
―올해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회복력 우수 지자체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 부문에서는 경기도 광명시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이어 수원시, 광주 북구, 성남시, 서울 성동구, 하남시,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여주시, 포항시가 뒤를 이었다. 영역별 최고 지자체는 환경 부문 광명시, 경제 부문 화성시, 사회 부문 구리시가 각각 차지했다. 종합 부문 상위 10곳 중 6곳이 수도권(광명, 수원, 성남, 서울 성동구, 하남, 여주)에 몰렸으며, 영역별 우수 지자체도 모두 경기 지역(광명, 화성, 구리)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경북 포항시 등 4곳만 포함됐다. 강소도시 1위는 전남 순천시가 선정됐으며, 강원 원주시, 전북 군산시·전주시, 전남 나주시가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는 대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주민 참여와 사회적 경제, 친환경 정책을 결합해 ‘작지만 강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
관련링크
-
한겨레 관련 기사 링크주소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744.html
352회 연결
- 이전글‘지역 회복력’ 으뜸 광명시…민관 협력 뿌리내리다 25.10.17
- 다음글‘플라스틱 재활용률 60%’ 이 동네...쓰레기를 돈으로, 자부심은 덤으로 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