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불안정 노동의 덫에 갇힌 청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불안정 노동의 덫에 갇힌 청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본문
청년이 결혼하고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성인으로 이행하는 삶의 긴 경로 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저출생에 대한 무수한 논의와 정부 정책은 출산과 관련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한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불안정한 사회에서 어른되기’ 세션에서는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자립하기까지의 ‘경로’와 ‘궤적’을 불안정노동, 젠더, 마음 상태 등의 열쇳말로 한국과 일본 청년들의 구체적 경험을 사례로 논의했다.
‘한국 불안정노동 계급의 윤곽’을 주제로 발표한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직면한 불안정노동 증가와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에 주목했다. “고용·소득·사회보험으로 불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 안에서도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정도가 상이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교수가 실증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즉, 청년 노동자층 1/3 이상은 지속해서 불안정 노동에 머물러 있지만, 약 1/3의 청년들은 오히려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불안정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자명해질 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예견된 경로다.
생애사적 관점에서 청년들의 이행에 주목한 노법래 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청소년기의 빈곤 경험이 청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삶의 만족도나 우울감, 자아존중감 같은 주관적 마음 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는 공부·취업·결혼·출산과 같은 경험에 영향을 주어, 이를 누락한 채 중년을 맞는 이들은 삶의 질도 황폐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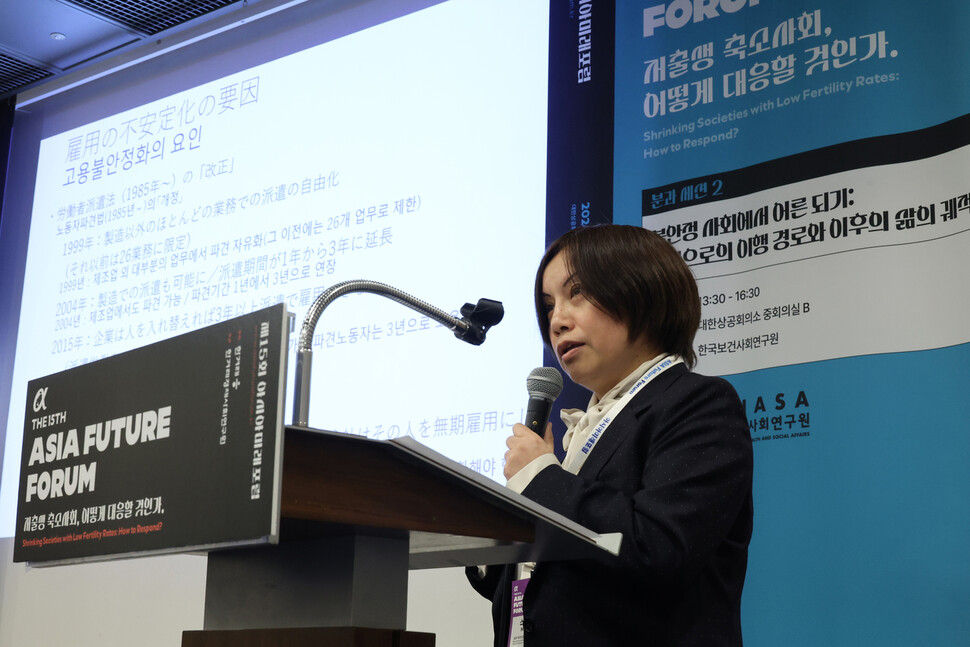
청년 내에서도 젠더와 사회계급에 따라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정도는 균질하지 않다. 일본의 비엘리트 청년 여성의 삶의 이행을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스기타 마이 일본 동경도립대학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물다 보니 일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렵고 미래 전망을 그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이 전문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젠더와 낮은 사회계층이란 이중의 불리함 속에서 교육, 취업과 함께 연애와 결혼, 출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직업계 고졸여성 청년들의 노동이행 경험 연구를 소개한 강명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고졸여성 노동자들은 뒤늦게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만,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불안정 노동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직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 단위에 맞춰져 있는 저출생 문제 프레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이를 많이 낳느냐는 식의 접근 방식은 개인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기에 경쟁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꼬집으면서 “서로 돌보는 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과 가족의 관계 변화에 주목한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 개인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학교, 일터, 여타 사회적 관계가 약화하는 동안 가족이 더 많은 역할을 떠맡았고 이로 인해 불평등이 더 심화하였다”고 지적했다.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hgy4215@hani.co.kr
관련링크
- 이전글극우포퓰리즘 시대, 보수의 미래 24.10.29
- 다음글인구위기에 더 무거운 지자체, ‘관계인구’ ‘지역순환경제’로 활로 찾기 24.10.29

 뉴스룸
뉴스룸